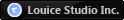사람들 사이에서는 무표정하게 있을 수가 없다. 울적한 기분을 알아 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서. 비굴하고 저열해.
기계적으로 일에 몰두하다 슬픔이 엄습하면 옥상으로 한 계단씩 오른다. 옥상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 때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멀거니 난간에 기대어 빌딩 밖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 뭐랄까, 치욕이다.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은 관심을 바라는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일. 이런 까닭으로 여러 번 헛걸음을 한 이후로는 어지간해선 오르지 않는다. 며칠 전부터 흡연구역이 옥상 하나로 제한되고 나서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젠 갈 곳이 없어.
한동안 일기를 쓰지 않았던 것도, 익명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각자가 서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보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피차일반의 비극.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 모른다고 생각한다. 의심 없이, 모른다고,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계속 써나가기로 했다. 회사 이야기만 쓰지 않으면, 이곳과 나 그리고 현실이 교차하는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아무 상관 없겠지. 지금처럼, 앞으로도, 두 공간을 교차하고 있는, 보여지는 쪽과 보는 쪽은 계속 서로를 모르는 척 할테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건, 모른다는 거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없이 있을 수가 없다. 둘이 남겨져 있을 때는, 너무나 곤혹스럽다. 정말이지… 혼자 택시를 타야할 때나, 술자리에서 덩그러니 둘만 남게 될 때, 거짓말과 허튼 소리를 남발한다. 다음날이면 어김없는 후회. 그저 침묵으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만이 진실해.
기억 속 할아버지는 말이 없다. 풍을 맞으신 탓에,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다가 말없이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그리도 서럽게 통곡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주 어릴 적에는 할머니의 어머니인, 증조할머니도 살아계셨는데, 그분도 말이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없다. 할머니댁의 그 날카롭던 계단턱과 벽을 손으로 짚으며 비스듬히 한계단씩 내려오던 모습을 기억한다.
이분들은 말이 없었다.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TAGS 일기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147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147